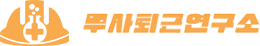광주 학동 붕괴 사고,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 작성일2025/05/07 10:05
- 조회 33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 4. 21.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116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 4. 21.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116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개요
-
사건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9일 16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
사고 대상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및 옥탑 구조물로 구성된 상가 건물(J빌딩).
-
사고 경위 : 철거공사 도중 상층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내부에 성토(폐기물·토사 혼합체)를 조성하고 중장비(30t 굴착기)를 올려 작업하던 중, 성토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되어 붕괴됨.
-
피해 결과 :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 사망, 8명 중경상.
-
시공사 : HDC현대산업개발
-
도급 구조 :
-
원도급: HDC현대산업개발
-
1차 하도급: C사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
재하도급: D사 (내부 철거 및 구조물 해체)
-
2. 사고 원인 및 문제점
(1) 해체계획서 미준수 및 임의 작업
-
해체계획서에는 고층부 해체를 위해 성토체를 건물 내부에 조성하라는 지침이 없었으나, 현장에서는 건물 하층 구조를 선제적으로 해체한 뒤 성토체를 쌓고 중장비를 진입시킴.
-
해체 순서, 방법, 장비 위치 등 작업계획과 실제 작업 간 괴리가 컸으며, 계획을 벗어난 자의적 시공이 진행됨.
(2) 구조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해체 방식
-
건물 내부 공간에 해체물과 토사를 혼합한 성토체를 최대 12m 높이까지 쌓은 후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건물 하부 구조에 과도한 하중을 유발하여 붕괴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높임.
-
굴착기 및 살수작업에 의한 추가 하중, 성토체 침하 등으로 인해 하부 보와 전단벽이 순차적으로 파괴됨.
(3) 하부 구조에 대한 보강조치 부재
-
지하층 전체에 대한 하중 지지 구조물(예: 잭서포트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공간에만 폐토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부실한 보강이 이루어짐.
-
전체 건물 면적과 비교할 때, 하부 보강은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
(4) 법적 의무 이행 미흡
-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시공자의 의무인 사전조사, 구조 안전진단, 작업계획서 이행,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누락.
-
원청(현대산업개발)은 해체계획서 이탈 여부, 해체순서 및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현장관리자를 통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시정·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 (판결 요지)
※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유사한 법리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 “법령상 주의의무 및 관리책임 범위”와 관련한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1) 법령상 주의의무 존재 및 위반
-
HDC는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건축법상 ‘공사시공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에 해당.
-
따라서 해체공사 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와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법령상 구체적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63조,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52조 등 관련 규정이 명시적 근거.
(2) 중대한 과실 판단
-
현장관리자가 해체계획서 미이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
-
위험성 높은 작업 방식(고하중 성토, 중장비 운용)을 시정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임한 점이 중과실로 평가됨.
-
“이 사건 해체공사는 명백히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원고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법령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
(3) 하도급 책임 회피 주장 기각
-
하수급인(C, D)의 작업이 사고를 초래했더라도, 도급인(원청)의 감독 책임은 배제되지 않으며 중첩적이라는 판단.
-
법원은 “원고는 해체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함.
(4) 행정처분의 적법성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기준상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에 해당 → 영업정지 8개월 적정.
-
피해자 9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춰볼 때, 오히려 처분 기준상 가중 사유도 존재.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
4. 시사점 (사업장 제언)
(1) 원청 책임의 범위 확대
-
도급·하도급 구조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은 행정책임 및 민·형사 책임에서 통하지 않음.
-
원청은 실제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수급인의 작업 이행 여부를 감독할 실질적 책임을 지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급인 책임 구조와 동일한 법리 기반.
(2) 해체공사에서의 계획이행과 구조안전 확보의 중요성
-
해체계획서의 수립뿐 아니라,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수.
-
고층 건물, 도심지 인접, 노후 구조물 등의 조건에서는 사전 구조 안정성 평가(안전진단)와 작업 단계별 시공관리가 사고 예방의 핵심.
(3)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의 Risk
-
중대재해처벌법 하의 경영책임자·도급인의 형사책임 판단 시 유사한 주의의무 위반 요소(계획 미준수, 위험성 방치 등)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 있음.
-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향후 대형 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제재 조치 역시 정당화될 가능성이 큼.
(4)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
철거 및 해체공사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계획 수립, 공정별 점검, 보강조치 확인 등 프로세스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
-
단순 '법률상 문서 제출'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